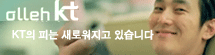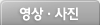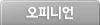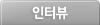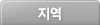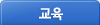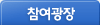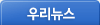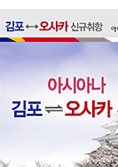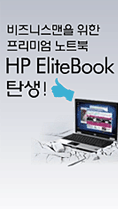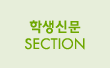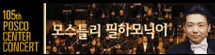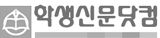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말글 환경은 학교 교육이나 고전 보다, 인터넷을 사용하며 익힌 통신언어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말투에서나 일기, 편지 등의 글에서 낯설고 거친 표현들을 자주 듣고 있을 것이다.
어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학생의 받아쓰기 능력이 10년 전에 비하여 훨씬 떨어졌다고 한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일기장을 들춰보면, 그곳에 우리 말글의 현실이 있다.
아이들의 성장기에 이같은 말글 환경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면, 이제 우리 말글의 앞날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에서 쓰이는 통신언어의 절반 이상은 은어와 비속어, 또는 무질서하게 급조된 국적 불명의 말들이다.
하기야 통신언어는 규범적인 현실 공간에서의 말글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로움과 새로움을 경험하려는 청소년들의 욕구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의사소통 기능이 보편적이지 못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지금과 같은 통신언어의 확산은 국민들의 실제 언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리 말글을 벼랑으로 내모는 데 한 몫을 거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미 통신언어는 세대간의 의사소통 단절까지도 염려될 정도로 특화되어 가고 있다.
말글 규범의 측면에서 보면, 통신언어 사용 실태는 가히 파격적이다. ‘밑에 있어요’를 ‘미테 이써요’처럼 받침을 뒷말에 이어 적는다든가, ‘되잖아’를 ‘되자나’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 현상은 차라리 애교 섞인 규범 이탈로 볼 수 있다.
네티즌들은 자기들만의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맞춤법 체계를 무너뜨린 표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가령 ‘아저씨, 아줌마’를 ‘아됴씨, 아듐마’라 하거나 ‘부끄럽다’를 ‘브꺼럽다’로, ‘고마워요’를 ‘곰아버영’
따위로 쓰는 것들이 그 보기이다. 요즘에는 한 걸음 나아가, ‘ㅋㄷㅋㄷ’ ‘ㅎㅎㅎ’ 들처럼 아예 초성의 낱소리 글자만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밖에, 음절을 줄여서 적는 현상도 이미 보편화한 지 오래다. ‘강아지’를 ‘강쥐’라 하거나 ‘미안하다’를 ‘먀나다’로, ‘남자친구’를 ‘남친’으로 적는 것은 물론 ‘선생님’을 ‘샘’으로, 심지어는 고유명사인 ‘서울’도 ‘설’로 줄여 적고 있다.
통신언어 사용 실태를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말글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가장 큰 문제가 비속어의 무차별적인 확산이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비어나 속어들도 통신언어에서는 더욱 진화되어 거칠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요즘 들어서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통신언어 순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대개 비어나 속어 사용을 막아 보려는 자정 노력이다.
주로 대화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은어의 남용도 우리 말글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당근이지’ ‘왕따’‘허접하다’ 등은 인터넷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이들에게도 익숙할 만큼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말들에 있는 게 아니라 비속어에 가까운 은어의 남용에 있다.
가령, ‘거짓말하다’를 ‘쌩까다’라 하고, ‘화난다’를 ‘짱난다’로, ‘무시당하다’를 ‘씹혔다’로, ‘노인’을 ‘노땅’으로 부르는 것들이 그러한 예이다.
언뜻 듣기에도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는 이러한 은어들이 사이버 공간 밖으로 튀어나와 청소년들의 일상어가 되다시피하고 있다.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말글은 청소년들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우리 말과 글이 당하고 있는 오늘의 위기는 우리 힘으로 이겨 나가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일이며 바로 내 일이다.
<성기지·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